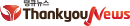숲길에서 만난 나무와 여러 가지 풀들과 꽃들은 제 멋대로 방치되어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이며 또한 상생의 지혜를 보여준다. 자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숲은 조화와 균형의 원리를 잘 유지하며 살아간다.
자연과 사람은 어떠한가. 자연은 야생성과 순수성을 의미한다. 자연과 상생하고 조화롭기 위해서는 사람도 자연을 닮아야 한다. 사람 역시 원래 자연이었기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지향점이 아닐까 싶다.
자연을 지배하면서 인간중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농업’을 영어로 ‘agriculture’라고 한다. 땅(agri)을 양육·경작(culture)하는 것이다. 그런데 ‘culture’는 문명·문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즉,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인간들이 땅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고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땅을 경작하여 먹을 것을 얻고, 그 부산물과 자연으로부터 얻은 재료로 집을 짓고 입을 것을 만든다.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인간의 소유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수탈적으로 변모했다. 자연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관계도 수직적 사회구조로 변모하였다.
수직적 사회구조는 공존 보다는 수탈적인 마인드를 갖게 마련이다. 자연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무엇이든지 소유하고 착취하려는 마음은 자연을 황폐하게 만든다.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이 감사하고 상생하는 마음이어야만 제대로 된 경작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문명의 꽃이 필 수 있다.
과연 농부는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농부는 가장 천리(天理)에 순응하고 천리간의 순리(順理)를 잘 알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농사를 짓는 것은 하늘의 일을 돕는 것이지, 하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늘이 돕지 않으면 곡식 한 알, 채소 한 잎도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농부와 자연은 동업자 관계다.
그런데 그동안 농업기술과 과학의 발달은 농업에 있어 자연조건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연구해 오면서 자연과의 상생보다는 수탈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른 바 산업혁명이후 획기적인 농업기술과 화학비료의 개발에 의한 ‘농업혁명’과 기계화로 인한 ‘녹색혁명’,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사가 가져온 ‘백색혁명’이 그것이다.
기계화와 화학비료 그리고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를 살포함으로써 농사는 편리해졌고 비닐하우스 농사로 인하여 계절과 상관없이 사철농사를 짓게 되어 식량의 양적생산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난 이후, 토양은 양분을 수탈당했고 환경은 피폐해졌다. 세계적으로 잉여농산물이 넘쳐나지만, 지구 한 모퉁이에서는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윽고 사람들은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식량의 양적증가 보다는 마인드의 문제이며 식품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지금 당장 관행농법을 완전히 자연농법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점차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소농위주의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관행농법으로 지은 곡식으로 예전보다 수확량은 늘릴 수 있겠지만, 동일 품목의 수입곡식 대비 가격경쟁력은 거의 10대 1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당분간 수확량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점차 땅심을 기르고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